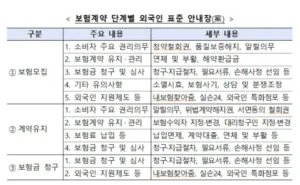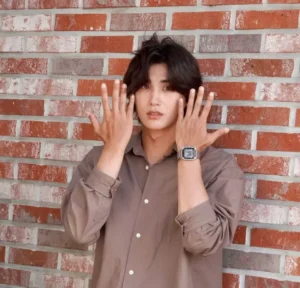치킨값 또 오르나? 배달 수수료 인상에 외식물가 급등 전망

배달 음식 시장에서 ‘이중가격제’라 불리는 배달가와 매장가의 차별적 가격 정책이 확산되면서 치킨 등 대표
외식 메뉴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같은 메뉴라도 배달 주문 시 매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외식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점주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차별화는 ‘배달가격제’ 혹은 ‘이중가격제’로 불리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다.
맘스터치는 올해 2월부터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세트는 매장에서는 7300원이지만, 배달 주문 시에는 8500원으로 1200원 더 비싸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맘스터치 뿐 아니라 치킨 업계 전반에서 확인된다. 치킨은 배달 비중이 70~80%에
달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 효과가 크다.
특히 bhc치킨은 이달부터 배달 앱에서 판매되는 메뉴 가격을 올린 가맹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전체 가맹점 3분의 2가 배달 가격을 인상했고, 인상 폭도 대부분 2000원에 달한다.
bhc치킨은 본사 차원에서 배달가격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 이 같은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
경쟁 프랜차이즈인 BBQ와 교촌치킨은 아직 배달가격제 도입 계획이 없으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자담치킨은 지난 4월 치킨 업계 최초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했고,
굽네치킨도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가격을 올렸다.
치킨 뿐만 아니라 햄버거 업계에서도 배달가격제가 일반화돼 있다. 버거킹은 대표 메뉴인 와퍼 세트를 매장가 9200원에서 배달가 1만600원으로 1400원 올려 판매 중이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배달 주문 시 5600원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등도 이미 지난해부터 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를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오래전부터 배달 메뉴 가격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 시장에서 가격 이중화 현상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점주들은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6% 상승했으나, 외식 물가는 25%나 올랐다.
특히 김밥(38%), 햄버거(37%), 떡볶이(35%), 짜장면(3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치킨 가격은 28%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가격 인상은 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음식을 두고 배달가가 이렇게 차이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 시장의 가격 구조 투명성과 수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정부도 배달앱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서비스 질 저하 우려와 공급자 이익 보장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업계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균형점 찾기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배달 음식 가격 상승과 관련한 소비자 불안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치킨 등 외식 메뉴의 배달 가격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가격 변화와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배달 주문 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배달 시장에서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으로 인해 치킨 등 대표 외식 메뉴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점주와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갈등, 정부의 정책 대응, 소비자의 선택 변화 등이 이 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